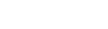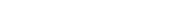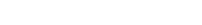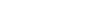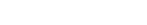멘붕 게임
너무 피곤한 날은 아이에게 책을 읽어주는 것조차 힘이 든다. 그럴 때면 ‘멘붕 게임’이라고 부르는 일종의 질문 놀이를 하곤 하는데, 방법은 이렇다. 아빠는 편안하게 침대나 소파에 누운 채로 쉽게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을 아이에게 던진다. 아이가 답을 하면 거기에 대해 질문을 이어나간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이다.
“선재야, 불은 위험한 거잖아? 위험한 일은 나쁜 거지? 소방관은 불을 끄는 위험한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나쁜 사람인 거네?” 이런 질문에 아이는 위험한 일을 하는 것은 좋지 않은 일이지만 왜 소방관 아저씨는 위험한 일을 하는 데도 나쁜 사람이 아닌지를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설명하려고 애쓴다. 대체로 아이는 “불은 위험하니까 불을 끄는 소방관 아저씨는 고마운 거야”라며 좋은 대답을 내놓지만, 목표는 아이의 멘붕에 있다 보니 질문은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그러면 위험한 것을 막기 위해서 위험한 일을 하는 건 괜찮은 거야?”
이런 질문은 사실 수사학적인 궤변에 가까운 것이지만 철학적으로 꽤 의미 있는 질문을 할 때도 있다. “선재야, 선재는 태어났을 때 지금보다 훨씬 더 작았고, 말도 하지 못했고, 그때는 심지어 걷지도 못했어. 그런데 지금은 키도 많이 컸고, 말도 잘하고, 뛰는 것도 잘하잖아? 아빠는 작고, 말 못하고, 걷지도 못하는 아이를 ‘선재’라고 불렀는데, 너는 지금은 아니니까 넌 선재가 아니지?” “그때의 선재가 자라서 지금 선재가 된 거야”라는 아이의 대답을 듣고 다시 물었다. “자라난 것은 달라진 거지? 달라졌으면 똑같은 것은 아니지? 그러면 그때 선재와 지금의 선재는 다른 선재겠네?” 이런 질문에는 아이가 다소 흥분하며 어째서 그때의 자신과 지금의 자신이 같은지를 설명해내려고 애를 쓴다. 이외에도 “선재는 엄마 뱃속에 있기 전에 어디에 있었을까?” “소·돼지도 가족이 있을 텐데 소와 돼지를 먹어도 되는 것일까?” 등등 멘붕 게임의 소재는 무궁무진하다. 이런 질문을 하고 있노라면 아이의 할머니는 답도 없는 쓸데없는 질문으로 아이를 헷갈리게 한다고 질타하신다. 물론 철학을 공부한 아빠로서도 이런 질문들에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아이의 어떤 대답은 아빠가 가진 대답보다 훨씬 더 근사할 때가 있다.
아이와 함께 누워 “엄마와 아빠가 정말 선재의 엄마, 아빠일까?”라고 물었다. “아빠가 선재의 아빠이고, 엄마가 선재의 엄마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 철학적으로 동일성 문제라고 알려진 문제를 멘붕 게임에 활용한 것이다. 아이는 자신 있게 말했다. “그건 냄새로 알 수 있어. 아빠는 왕자 냄새, 엄마는 공주 냄새가 나잖아.” 아, 냄새… 이건 도저히 다음 질문을 할 수 없게 만드는 대답이었다. 이 얼마나 근사한 대답인가! 마치 마르셀 프루스트가 마들렌 한 조각의 향내에서 과거의 똑같은 향내를 기억해내며 행복해하는 것처럼 아이는 아빠의 냄새로부터 이 사람이 내 아빠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일까?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아빠라는 확신은 ‘냄새’에서 온 것이다.
아빠의 말보다 아이의 말이, 가르치는 말보다 때로는 질문이 더 의미 있다. 여우가 어린왕자에게 알려주듯이 “매우 중요한 건 눈에 잘 보이지 않는다.” 아이가 품고 있는 냄새의 존재론, 아이가 살고 있는 시적 세계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한 것은 어쩌면 쓸데없는 이런 질문들 때문이었는지도 모른다. 아이가 아니었더라면 내게서 왕자 냄새가 난다는 중요한 사실도 알기 어려웠을 것이다. 질문으로 아이의 마음에 창문을 내자. 멘붕 게임을 권해본다.
글을 쓴 권영민은 서양철학을 전공하고 현재 ‘철학본색’이라는 철학 교육, 연구 모임을 운영하고 있다. 얼마 전 블로그(spermata.egloos.com)에 썼던 에세이를 모아 <철학자 아빠의 인문 육아>를 출간했다. 대답보다는 질문을 하고자 하는 철학이 좋은 부모로 살아가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 믿는다.
일러스트 최익견 | 담당 오정림 기자 | 맘앤앙팡 2015년 2월호
 asteroh 2015.09.16
asteroh 2015.09.16 0
0
 0
0
 cined***@naver.com 2015.08.02
cined***@naver.com 2015.08.02 1
1
 1
1
 songsm0***@naver.com 2015.04.19
songsm0***@naver.com 2015.04.19 0
0
 0
0